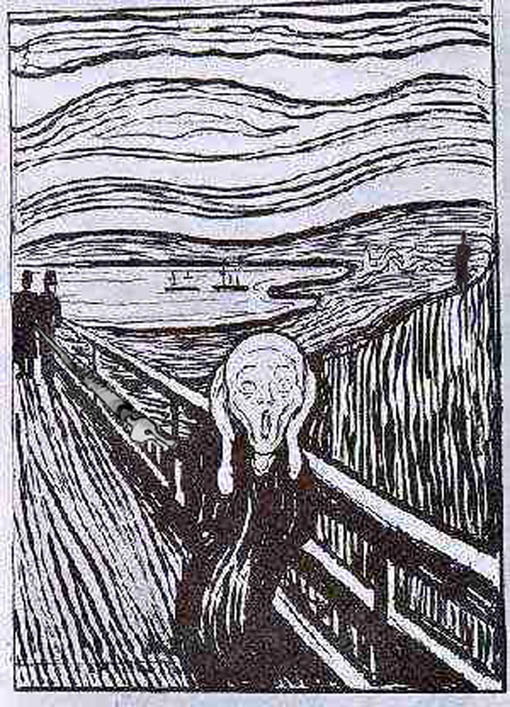
펜은 칼보다 악랄하다
삼국지 등장인물 가운데 진림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원소 밑에 있으면서 조조를 토벌하자는 뛰어난 격문을 남겼다. 아버지·할아버지까지 3대를 싸잡아 몰아붙인 명문장에 조조의 모골이 송연해지고 식은땀을 흘렸다고 원전에는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원소가 조조군에게 패한 뒤에 그는 “나의 말과 글은 활시위에 얹힌 화살이라 활을 쏘는 사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갈 뿐이다.” 라는 변명을 남기며 조조에게 투항하고 만다.
화살을 재우는 활의 한가운데를 가리켜 한통속이라 하듯 원소와 진림은 한통속이었고, 전시에서 수 만명의 창끝보다 날카로웠던 진림의 악랄한 글은 사실관계를 떠나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현세의 언론에서 내뱉는 말과 글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더구나 해당 언론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파급력이 상당하다면 더욱 한통속이 되서는 안되는 것이고, 사실관계를 벗어나거나 비약하게 된다면 더더욱 안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퇴임한지 1년 남짓한 대통령을 ‘1억짜리 시계를 찬 600만불의 사나이’ 로 전락시키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범부에게도 주어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뿐하게 무시하고 전직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했다. 그들이 주목하고자 했던 것은 600만불이나 시계가 아니었고, 그들이 흠집 내고자 했던 것은 전직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했던 도덕성과 자존심이었다.
언론은 흉기처럼 그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야구장의 치어리더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도 현란한 응원 동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에서 구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치마를 들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치마를 들추는 것도 모자라서 어떤 팬티를 입었는지, 비데를 사용했는지조차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이건 정치와 언론관계를 떠나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신문이 더 이상 국민과 법위에 군림하고 특권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집권 초기의 의지나 “사실과 다른 엄청난 많은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로 마구 쏟아지고, 누구의 말을 빌렸는지 출처도 불명한 의견이 마구 나와서 흉기처럼 사람을 상해하고 다니고, 그리고 아무 대안도 없고 대안이 없어도 상관없고 그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배상도 안하고 그렇게 하는 상품.”이라고 비난했던 2007년 1월의 말에서와 같이 집권 내내 언론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던 노무현의 언론개혁은 결국 실패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언론은 ‘흉기처럼 그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것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언론개혁이 실패했다는 명약관화한 반증이고 한낱 촌부가 보기에도 앞으로 한동안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원망하지 마라. 우리 탓이다
아내의 말이 “여보! 노대통령 살아 생전에 봉하를 한번 다녀올걸 그랬어”
하지만 먹고 사는 일이 급급한 터에 다음으로 다음으로 미룬 것이 결국 다시는 못 뵙게 되었다.
변명이라면, 그는 항상 거기 있을 줄 알았기 때문이다.
지치고 힘들 때 찾아가던 뒷산의 큰 나무 그늘처럼 항상 거기 있을 줄 알았다.
뒤 돌아 보면, 여태껏 그는 항상 거기에 있었다.
김영삼이 배신하고 이기택이 배신하고, 이인제가 배신하고 김민석이 배신했을 때도 누군가는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우리가 그에게 다가선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민주의 이름을 팔아 우리에게 침을 뱉고 배신하며 떠날 때, 그가 혼자서 우리에게 남아 준 것뿐이다.
정치가 의리를 지킬 때 국민도 의리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그런 그를 우리가 버렸다.
누굴 탓할 것도 없이 우리가 그를 버렸다.
그가 스스로 자신을 버리라 했어도 끝끝내 붙잡았어야 했다.
그것을 잊고 있으면 안된다.


